고정 헤더 영역
상세 컨텐츠
본문

中和經集(중화경집)
第五章 虛靈爲體 智覺爲用(허령위체 지각위용)
허령을 체로하고 지각을 용으로 한다.
이 章(장)은 마음을 텅 비움으로서 영이 생겨남을 道體(도체)로 삼고
지혜가 생김으로서 깨달음이 열림으로 이것을 용사로 삼는 이치를 밝히시고,
정성을 다하여 마음닦는 공부를 하게 되면
거기서 神明(신명)이 자연히 발생하는 이치를 말씀하시고
道(도)의 體(체)와 用使(용사)를 설명하신 글이다.
性者(성자)는 乃天命之全體(내천명지전체)요.
人心之至正(인신지지정)이니 所謂體用(소위체용)이니라.
體(체)는 所以立(소위입)이니 心之誠(심지성)이 爲本(위본)이며
虛靈之體(허령지체), 以行(이행)이며 道之行(도지행)이 爲用(위용)이니
智覺(지각)은 心之用(심지용)이니라.
성(性)은 하늘에서 내려준 생명의 전체이며,
사람 마음의 가장 바른 것이니, 이른바 몸(體)과 용사(用使)이다.
체는 소이 세우는 것이니,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는 것을 근본이 하며,
허령은 마음의 근본(체)이 된다. 용사는 소이 행함이니, 도를 행함이 곧 쓰임이 됨으로
지각은 마음의 용사가 된다.
靈者(영자)는 體之存(체어존)이요.
其體(기체)를 謂之道(위지도)라 하니
道之用(도지용)은 不可窮(불가궁)이오.
영(靈)은 몸안에 존재함으로써
그 몸이 곧 도체(道體)라 하니,
도의 쓰임은 가히 끝이 없다(무궁 무진 하다).
智者(지자)는 用之發(용지발)이요.
其用(기용)을 謂之神(위지신)이라 하니
神之用(신지용)은 不可測(불가측)이오.
지(智)는 쓰임을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쓰임을 이른바 신이라 하니
신의 쓰임을 가히 측량 할 수가 없다.
寂者(적자)는 感之體(감지체)니
其體甚微(기체심미)하야
理無不明(이무불명)하고
感者(감자)는 寂之用(적지용)이니
其用(기용)이 甚顯(심현)하야
誠無不格(성무부격)하며
物無不備(물무부비)니라.
적(寂)은 느낌의 체가 되니
그 몸이란 것이 심히 미묘하여
그 속에서 우러나오는 이치가 밝지 않음이 없다.
느낌(感)은 고요함의 쓰임이 되니
그 쓰임이 뚜렷이 나타나서
정성을 다하면 감응하지 않음이 없고,
또 만물이 모두 갖추고 있다.
증산(甑山) 상제께서는 성인(聖人)이 어떠한 곳에서 나온다고 하였는지 알아보자.
천지개벽경(天地開闢經) 5권 을사(乙巳: 1905년)편 5절에,
『又曰(우왈)......
黑子孤城(흑자 고성)은 草屋數間也(초옥수 간야) 오......
曰(왈) 草幕之家(초막지가)에 聖人(성인)이 出焉(출언) 하노라』
증산(甑山) 상제께서 말하기를
성인(聖人)이 몇 칸 안 되는 허름한 집
草幕之家(초막지가)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밝히는 말이다.
격암유록(格菴遺錄) 은비가(隱秘歌)를 보면,
『欲知生命處心覺(욕지생명처심각) 金鳩木兎邊(금구목토변)
木木村목목촌(鄕향) 人禁(인금)
人棄之地(인기 지지)
獨居可也(독거 가야)
朴固鄕處(박고 향처) 處瑞色也(처서색야).
是亦十勝地矣(시역 십승지의)』
명(命)을 보존할 곳을 알려면, 마음으로 금구 목토 변(金鳩 木兎 邊)을 깨달아라.
목 목촌(木 木村) 즉 정도령이 있는 곳은 사람들이 꺼리고(人禁:인금),
멀리하는 곳인데(人棄 之地:인기 지지)
이곳은 홀로 거주하고 있는 곳(獨居:독거)이다.
박(朴)이 있는 이 고을(固鄕)은 상서로움(瑞)이 깃드는 곳으로,
이 곳 역시십승지(十勝地)다라고 하였다.
선현 참서(先賢讖書) 중 수명 진주 출세 결(受命眞主出世訣)에,
『十勝良好(십승 양호) 他 人棄處(타 인기처) 我亦取之(아역 취지)
非山非野(비산비야) 臥牛獨家村(와우독가촌)
不入 深山(불입 심산) 不入 深谷(불입 심곡)』
십 승이란 좋은 곳인데 사람들은 꺼리고 멀리하지(棄處:기처)만,
우리 임금은 그 꺼리는 곳에 있는 것이다.
비산비야(非山非野)란 소(牛)가 홀로 누워 있는 집 동네를 말하는 것이니,
깊은 산(深山:심산)이나 깊은 골짜기(深谷:심곡)에 들어가지 말라(不入)고 하였다.
한 마디로
십승지(十勝地)인 비산비야(非山非野)란,
소(牛)인 정도령이 홀(獨)로 살고 있는 집과 동네(家村)을 이르는 말이라고 하는 말이다.
그러니 정도령을 찾아서 깊은 산(深山:심산)이나 깊은 골짜기(深谷:심곡)로 찾아가지 말라는 것이다. “라고
명산 선생이 설명을 하자,
증산(甑山) 사상에 관심이 많은 듯한 한 사람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대순전경(大巡典經) 제4장 천지운로(天地運路) 개조공사(改造公事) 130절을 보면,
『또 종이에 철도선(鐵道線)을 그려 놓고 북(北) 쪽에 점(點)을 치사 정읍(井邑)이라 쓰시고,
남(南) 쪽에 점(點)을 치사 사거리(四巨里)라 쓰신 뒤에
그 중앙(中央)에 점(點)을 치려다가 그치기를 여러 번 하시더니,
대흥리(大興里)를 떠나실 때에 점(點)을 치시며 가라사대
‘이 점(點)이 되는 때에는 이 세상(世上)이 끝나게 되리라’ 하시더라』
라고 하였는데,
이 글의 내용으로 보아서는 정읍(井邑)이란 바로 정도령이 있는 곳을 말하는데,
정도령이 살고 있는 집의 위치를 설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자
또 한 사람이 말하였다.
“제가 이 글을 보기에는 정읍(井邑)이란,
정도령이 살고 있는 동네를 설명한 것인데,
그 정도령이 살고 있는 동네의 북(北) 쪽에는 철도(鐵道)가 있고,
남쪽에는 사거리(四巨里)가 있으며,
그 가운데 즉 중앙(中央)에 점(點)을 치려다가 여러 번 주저하였다고 하니,
그 동네 이름이 혹시 중앙(中央)이라고 불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그 중앙(中央)이라는 동네 이름이 세상에 드러나는 때에는,
세상이 다 끝나게 되는 때라고,
증산(甑山) 상제께서 매우 망설이다가 할 수 없이 밝히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
라고 말하였으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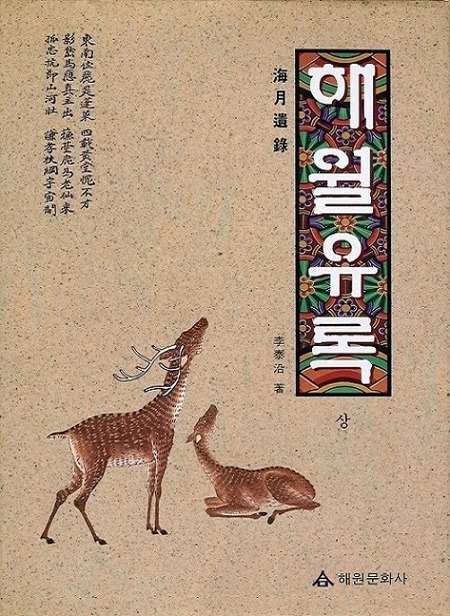
'■ 중화경 (中和經)' 카테고리의 다른 글
| 中和經集(중화경집), 第七章 鬼神隱顯之理(귀신은현지리), 귀신의 숨고 나타나는 이치. / 비산비야(非山非野)는 인천(仁川)으로 (0) | 2022.10.12 |
|---|---|
| 中和經集(중화경집), 第六章 人者 鬼神之會也(인자 귀신지회야), 사람은 귀와 신의 모임이다. / 십승길지(十勝吉地)는 손사방(巽巳方) (1) | 2022.10.11 |
| 中和經集(중화경집), 第四章 心者 神明之本(심자 신명지본) / 마음은 신명의 근본이다. / 明公(명공)이 其誰오 / 明顯/明承/察明 (1) | 2022.10.09 |
| 中和經集(중화경집), 第三章 道之大本與 達道(도지대본여 달도) / 도의 큰 근본과 도에 이르는 일 (1) | 2022.10.08 |
| 中和經集(중화경집), 第二章 道之體用(도지체용), 도의체와 용사, (1) | 2022.10.03 |





